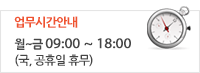건강/의학상식
| 번호 | | | 글쓴이 | | | 제 목 | | | 등록일 | | | 조회수 |
|---|
1077
dcgnlsmn
목 건강 적신호 ‘성대결절’ 여성이 남성의 2배
2014. 06. 17
2159
건보공단, 2013년 성대결절 진료비 자료 분석결과 발표
목소리 건강의 이상신호인 성대결절 질환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잘 걸리며 특히 교육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성대결절(J3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9만 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 1733명, 여성 6만 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아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지역 1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자격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성대결절이 교사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교 가입자를 교육직과 비교육직으로 나눠 살펴봤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교육직 종사자(760명)가 비교육직(167명) 보다 많았으며, 교육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직 진료인원(10만 명당 760명)은 전체 진료인원(10만 명당 195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교수는 “교사는 직업상 음성의 톤에 권위가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 앞에서 힘을 줘 발성하려는 경향이 잦고, 주변 소음을 이기기로 위해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성대에 압박과 긴장을 주게 돼 성대결절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대결절’ 질환의 연도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9만 836명에서 2013년 9만 7438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다. 월별 진료인원은 대체로 5~6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교수는 “3, 4월에는 큰 일교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상기도 감염이 많이 발생해 성대의 급성점막부종 및 염증이 생기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다. 대부분 간단한 음성휴식이나 약물치료로 쉽게 사라지는데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음성을 사용할 경우 성대결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교사들의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충분한 음성휴식으로 성대결절 발생이 감소하나, 새학기 시작 후 음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간헐적인 목소리 변화로 나타났다가 지속적인 음성남용으로 인해 성대결절로 진행돼 5~6월에 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9억 1700만 원이며, 진료형태별로 외래는 44억 8800만 원, 입원은 5억 9800만 원, 약국은 18억 3000만 원이었다.
◇ 성대결절 예방 및 관리요령
한편, 다음은 신향애 교수는 ‘성대결절’의 예방 및 관리요령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1. 성대점막의 윤활작용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2. 지나치게 장시간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피하고, 목에 힘을 주고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3. 속삭이는 소리 역시 성대에 좋지 않으므로 피해야 하며,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도 피해야한다.
4. 큰 소리를 내기 쉬운 시끄러운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이 쉬거나 피곤할 때는 음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5. 전반적인 신체의 피로가 목소리에 나타나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이 목소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6. 술과 담배를 끊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카페인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잠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등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성대결절(J3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9만 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 1733명, 여성 6만 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아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지역 1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자격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성대결절이 교사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교 가입자를 교육직과 비교육직으로 나눠 살펴봤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교육직 종사자(760명)가 비교육직(167명) 보다 많았으며, 교육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직 진료인원(10만 명당 760명)은 전체 진료인원(10만 명당 195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교수는 “교사는 직업상 음성의 톤에 권위가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 앞에서 힘을 줘 발성하려는 경향이 잦고, 주변 소음을 이기기로 위해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성대에 압박과 긴장을 주게 돼 성대결절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대결절’ 질환의 연도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9만 836명에서 2013년 9만 7438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다. 월별 진료인원은 대체로 5~6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교수는 “3, 4월에는 큰 일교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상기도 감염이 많이 발생해 성대의 급성점막부종 및 염증이 생기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다. 대부분 간단한 음성휴식이나 약물치료로 쉽게 사라지는데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음성을 사용할 경우 성대결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교사들의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충분한 음성휴식으로 성대결절 발생이 감소하나, 새학기 시작 후 음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간헐적인 목소리 변화로 나타났다가 지속적인 음성남용으로 인해 성대결절로 진행돼 5~6월에 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9억 1700만 원이며, 진료형태별로 외래는 44억 8800만 원, 입원은 5억 9800만 원, 약국은 18억 3000만 원이었다.
◇ 성대결절 예방 및 관리요령
한편, 다음은 신향애 교수는 ‘성대결절’의 예방 및 관리요령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1. 성대점막의 윤활작용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2. 지나치게 장시간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피하고, 목에 힘을 주고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3. 속삭이는 소리 역시 성대에 좋지 않으므로 피해야 하며,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도 피해야한다.
4. 큰 소리를 내기 쉬운 시끄러운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이 쉬거나 피곤할 때는 음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5. 전반적인 신체의 피로가 목소리에 나타나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이 목소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6. 술과 담배를 끊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카페인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잠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등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 베이비뉴스 / 오진영 기자(pr@ibabynews.com)